[제물포시대-김광성의 개항장 이야기]
(1) 1920년대 제물포항
(1) 1920년대 제물포항
변화는 기억을 지워버린다. 광속시대에 편승해 남기느냐 부수느냐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한국 근현대사의 유구(遺構)들은 무수히 사라져 갔다. 외형적인 것만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정한(情恨)이 녹아 있는 기억마저 더불어 지워졌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쉬운 것은 시간의 흔적이라는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 개항장을 그려온 김광성 작가가 최고와 최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항장의 근대 풍경과 당대 서민들의 생활상, 손때 묻은 물상들을 붓맛에 실어 재구성하여 독자들과 공유한다.

바다가 트이고 뱃길이 열리면서 도래한 대항해 시대, 세계 도처의 항구는 교역의 통로가 되었고 정복자의 관문이 되었다. 조용한 은자의 나라, 조선의 한 작은 포구였던 제물포도 이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천혜의 정박지인 월미도가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두 차례의 양요로 잔잔했던 제물포 앞바다는 요동을 쳤다. 조선 정부는 허약했다.
1920년대 그림처럼 제물포는 점령자의 손에 의해 국제항구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하지만 응봉산의 존스톤 별장(그림의 언덕 위)이 제물포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이 이국적인 전경이 자국민들에겐 결코 아름다운 풍광일 수 만은 없었다.
일인들은 백년대계로 건축물들을 켜켜이 쌓아 올렸고 상권마저 거머쥐었다. 한인들은 정미소나 성냥공장의 직공이 되거나 칠통마당의 목도꾼(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밧줄로 얽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러나 그런 역사와는 별개로 갈매기와 쌍고동과 마도로스와 네온싸인과 선술집, 향수를 달래는 여인의 구슬픈 가락의 애환이 있었다고 시인 묵객들은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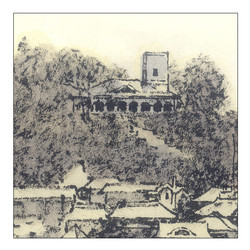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